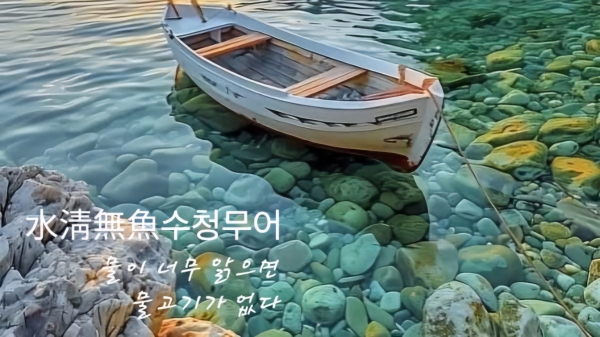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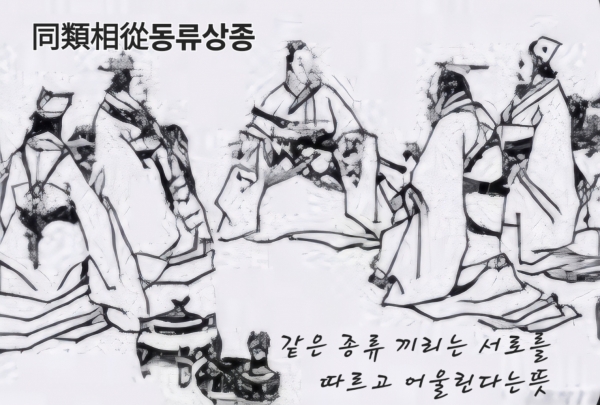
필자의 고교동창 단톡방에는 매일 좋은 글귀가 적힌 카드를 보내는 친구가 둘이나 있다. 보통 하루에 하나씩, 그러다 기분 내키면 두 개도 띄운다. 문자 그대로 주옥같은 글귀로 인생의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을만한 것들이다.
며칠전에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사는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벗이 없다. -공자-'라는 글이 띄워졌다. 이는 공자가어(孔子家語) 입관편(入官篇)의 '水至淸則無魚 人至察則無徒(수지청즉무어 인지찰즉무도)'라는 구절의 번역이다.
이 말은 공자가어뿐만 아니라 대대례기(大戴禮記)와 한서(漢書) 동방삭전(東方朔傳) 등에도 실려있는, 중국에서 옛부터 전해오는 격언이다. 여기서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수청무어(水淸無魚)', 또는 '물이 맑으면 큰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수청무대어(水淸無大魚)'라는 성어가 유래했다.
이를 다시 부드럽게 해석하면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으며, 사람이 너무 꼬치꼬치 따지면 주위에 가까이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공자의 제자로 공문칠십이현(孔門七十二賢) 중의 한 사람인 자장(子張)이 관직에 나가며 훌륭한 관리가 되는 요체(要諦)를 물었을 때 공자가 대답한 첫마디였다. 공자의 충고는 더 이어진다.
‘枉而直之 使自得之 優而柔之 使自求之 揆而度之 使自索之(왕이직지 사자득지, 우이유지 사자구지, 규이도지 사자색지)’. ‘휜 것은 곧게 하되 그들 스스로 곧게 할 수 있도록 하라. 뛰어난 사람들을 복종케 하되 스스로 모이게 하라, 법도를 바로 잡되 그들 스스로 찾도록 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공자의 첫마디만을 '따지고' 있다. 명나라 홍자성(洪自誠, 1573~1619)은 채근담(菜根譚)에서 이렇게 부연하고 있다.
‘地之穢者多生物 水之淸者常無魚 故君子當存含坵 納汚之量 不可持好潔獨行之操(지지예자다생물 수지청자상무어 고군자당존함구 납오지량 불가지호결독행지조)‘. ’더러운 땅에는 초목이 무성하고,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때 묻고 더러운 것이더라도 받아들이는 도량을 가져야지, 혼자서만 깨끗하다고 고집하면 안된다’는 의미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서 특히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말이 되었다. 사람이 너무 맑고 깨끗하며 꼬치꼬치 따지다보면, 주위에 사람이 모이지 않고 편협한 사람이니 큰 정치인이 되지 못한다는 핑계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부정부패도 너그러움 혹은 포용력이란 이름으로 감싸야 큰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견강부회(牽强附會)하고 있다.
그래야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조직이 통합된다고 자기합리화를 한다. 그러나 공자가 '수청무어'라 한 뜻은 그런 더러움을 함께하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오물이 묻었으니 너도 괜찮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나와 달라도 좋은 의견이라면 '살피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포용력을 말한 것이다. 설사 상대진영일지라도 좋은 의견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과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동류상종(同類相從)'이란 성어는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를 따르고 어울린다'는 뜻으로 장자 외편 제31 어부(漁父)편의 ‘同類相從 同聲相應 固天之理也(동류상종 동성상응 고천지리야.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 어울리고, 같은 소리가 서로 호응하는 것은 본래 자연의 이치다)’라는 구절에서 유래했다.
이는 순자(荀子) 정론(正論)편의 '이류상종(以類相從)'과 같은 의미이며, 주역 계사(繫辭) 상편의 ‘方以類聚 物以群分 吉凶生矣(방이류취 물이군분 길흉생의. 삼라만상은 그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모이고, 만물은 무리를 지어 나뉘어 살고 거기서 길흉이 생긴다)’에서 유래한 '물이유취(物以類聚)'와도 같은 뜻이다.

이맘때면 덕수궁 연못가의 오래된 개암나무가 꽃을 피운다. 지난 가을 말라버린 잎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기 때문에 꽃 인줄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이다. 오리나무, 자작나무의 꽃처럼 동물의 꼬리모양을 닮은 꼬리꽃차례로 길게 늘어진 수꽃이다.
나뭇가지와 같은 갈색의 수꽃에서 노란 꽃가루가 바람에 날릴 때면, 나뭇가지 겨드랑이에 작은 겨울눈(冬牙)처럼 달렸던 암꽃이 핀다. 자세히 보아야 꽃으로 보일 정도로 작은 말미잘 촉수를 닮은 붉은 자줏빛 암술이 나온다.
수꽃과 암꽃이 피는 시기가 다른 이유는 자가불화합성(自家不和合性, self-incompatibility), 즉 한 꽃에서 나온 꽃가루가 그 꽃이나 같은 가지의 다른 꽃 암술에 수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동종자가교배 방지의 메커니즘 때문이다.
자신의 꽃가루를 받아 자가합성을 하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장점도 있지만, 유전형질의 다양성이 떨어져 극한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전멸당할 위험이 뒤따른다. 이는 이종교배를 통해 탄탄한 유전자를 가진 후손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우리 인간이 근친교배를 막는 것과 같은 이유이기도 하다.
개나리는 원래 동종자가교배를 방지하기 위해 암술머리와 수술머리의 높이가 서로 다른 자웅이위(雌雄異位, herkogamy)이다. 그럼에도 인간에 의해 같은 지역에 대량 집단으로 심어지는 개나리는 동일한 종들이다. 유전자가 같은 종 사이에는 화분관(花粉管, pollen tube)을 내지 않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나리가 봄의 전령사로서 꽃은 흐드러지게 피우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는 까닭이다.
생물이 복잡한 구조 가운데 다양한 유전자를 유지•보유함으로써 극한상황을 극복해 나가듯이, 우리 인간도 그에 못지않은 다양한 생각과 거기에 따른 사회조직이어야 위기상황을 맞았을 때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유유상종(類類相從), 끼리끼리 모여 이놈이나 저놈이나 같은 동종집단으로 채워져 다양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선 급변하는 국내•국제적 위기상황을 대처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자신을 따르며 도와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주역 건괘(乾卦) 문언(文言)에는 ‘同聲相應 同氣相求...各從其類(동성상응 동기상구...각종기류)’라는 말이 있다. ‘같은 소리를 가진 사람은 서로 만나면 크게 반응하고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서로 찾을 수밖에 없다...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의 짝을 찾아 만나는 것이다’는 뜻이다.
지도자는 나와 같은 소리,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그 순간 나의 능력은 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소리와 뜻에 맞는 사람을 좇는 경향이 있다. 나와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꿈은 현실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그렇게 말대로 쉽지 않다. '동류상종'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서 '동성상응'하기란 더욱 어렵다. 이때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소리를 조율해 아름다운 음악으로 재탄생시키는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로가 바로 훌륭한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없는 맑은 개울물이 시냇물을 이루어 강물에 흘러가고 강물은 또한 바다를 만들지 않는가. 저 망망대해(茫茫大海)를 보라. 저토록 넓고 깨끗한 물에서 크고 작은 물고기와 온갖 생물이 함께 모여 큰 사회를 이루며 살고 있지 않은가.
| 이형로는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대만대학 철학연구소와 교토대학 중국철학연구소에서 수학 후 대학 등에서 강의를 했다. 현재 덕수궁에서 근무하며 스스로를 '덕수궁 궁지기'라고 부른다. 저서로는 ‘궁지기가 들려주는 덕수궁 스토리’, ‘똥고집 궁지기가 들려주는 이야기’(2018년)에 이어 최근 ‘궁지기가 들려주는 꽃*나무의 별난이야기' 1~9권을 잇따라 펴냈으며 현재 10권을 준비중이다. 구산스님께 받은 '영봉(0峰)'과 미당 서정주 선생께 받은 '한골', 그리고 스스로 지은 '허우적(虛又寂)'이란 별명을 쓰고 있다. |


